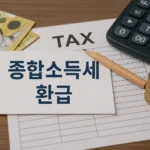“14% 수익률에 쏠리는 눈…브라질 채권, 다시 기회일까”
국채 투자가 개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주가연계증권(ELS)의 연이은 손실 사태 이후, 예측 가능한 수익률과 상대적 안정성을 지닌 국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연 2~4%대의 수익률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었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국채 시장에 개인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이 시기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퍼지면서 한국과 미국 국채의 매력은 다소 둔화되고 있다. 한국 국채는 2%대 중반에서 수익률이 정체되고 있고, 미국 국채 역시 높은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 확장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의외로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높은 기준금리로 대표적인 고금리 채권 국가다. 지난달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해 연 14.25%로 끌어올렸다.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이미 14%대 중반을 넘기고 있다. 표면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글로벌 어느 시장에서도 찾기 힘든 수익률이다. 당연히 자산가와 고위험 감수 투자자들 사이에서 브라질 국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물론 이 같은 고금리의 배경에는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정치적 불안,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 등을 반복해온 나라다. 앞서 2010년대 초반에도 비과세 혜택과 10%대 수익률을 내세워 한국에서도 브라질 국채가 ‘고금리 재테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환율 급변동과 브라질 경제의 변동성이 현실화되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시장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다시 브라질 국채를 바라볼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브라질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추가 인상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정치다. 재정 확대에 보수적이었던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친시장적 혹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는 15일 발표될 예산지침법이 어떤 재정 목표를 설정할지에 따라 브라질 국채의 투자 매력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역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브라질이 지닌 원자재 공급국으로서의 전략적 위치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주요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브라질은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기 방어력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점은 고금리라는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브라질은 어디까지나 신흥국이며,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정치·재정 불확실성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과거 사례에서처럼 고수익을 좇은 투자가 환율 급락과 신용등급 하락 등 외부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은 브라질 채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시장은 언제든 출구가 좁아질 수 있다. 투자에 앞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시 떠오르는 브라질 채권, 그 높은 수익률 이면에 놓인 위험의 무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NH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 출처 = 농협은행]](https://miredaview.com/wp-content/uploads/2025/06/news-p.v1.20250523.ac08096f63664c76b4737e5a17911ee0_P1-150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