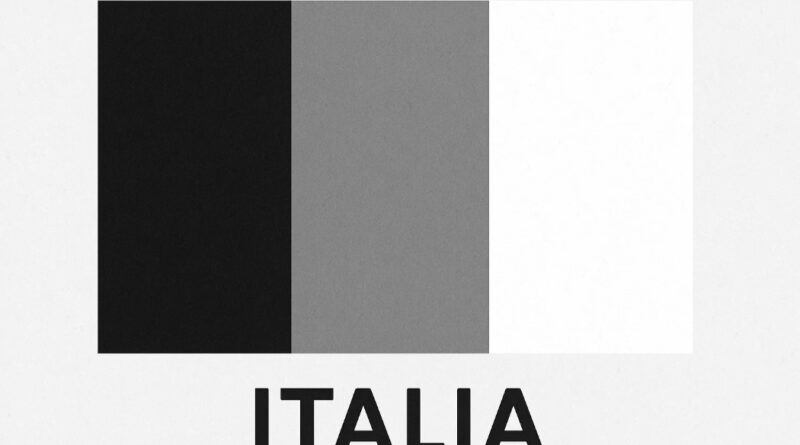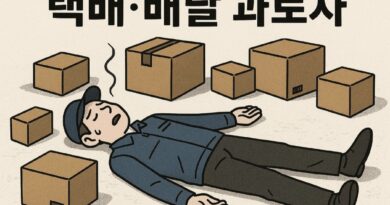딥페이크 규제부터 디지털 자산 과세까지… 메타버스 새 질서 시작 되나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 공간과 현실 사회의 경계 문제에 다시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AI의 악용을 고위험군으로 규정하고,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기술 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민주적 질서를 보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국 역시 같은 흐름을 피할 수 없다. 2024년 제정된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령이 발효되며,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용자 보호, 산업 육성, 규제 체계 마련에 본격적인 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산업 단위로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업계는 콘텐츠 관리, 사용자 신고 체계, 차별적 행위 제한 등을 포함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제도적 움직임과 함께 메타버스 커뮤니티는 점점 더 현실 사회와 맞닿고 있다. 팬덤 모임이나 직장 회의, 대학 강의와 같은 일상적 활동이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면서, 아바타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유료 아이템이나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디지털 계급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현실의 불평등 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메타버스는 더 이상 가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가상 토지 거래와 NFT 아이템 판매는 실제 화폐와 연결되며, 과세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불러왔다. 한국의 메타버스 법 시행은 이러한 문제에 제도적 기초를 제공했지만,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정체성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일부 이용자는 현실보다 가상 공간에서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관계와 시간을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고립이나 현실 관계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 메타버스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찾거나 사회 운동을 전개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셈이다.
이탈리아의 AI 규제 법안과 한국의 메타버스 법제화는 메타버스가 더 이상 ‘놀이 공간’에 머무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상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과 경제 활동은 현실의 법과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고, 책임도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메타버스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규제와 윤리가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